[인터뷰] 김상정 선생 손녀 김부용 씨
“치열하게 조국을 사랑했던 할아버지의 흔적 담긴 생가 보존하는데 최선”

[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] 지난 11일 만난 김부용(71)씨는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 얼굴에 복잡한 심정이 나타났다.
남다른 기개로 일제의 폭거에 굴하지 않고 조국을 위해 싸운 할아버지가 한없이 자랑스럽지만 쓰러져가는 생가를 보면 후손으로서 부끄러움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이란다.
할아버지에 대한 김 씨의 기억은 단편적이지만 강렬했다. 6살 때 언니의 등에 업힌 채 마주한 할아버지의 상여 나가는 모습은 아직도 생생하다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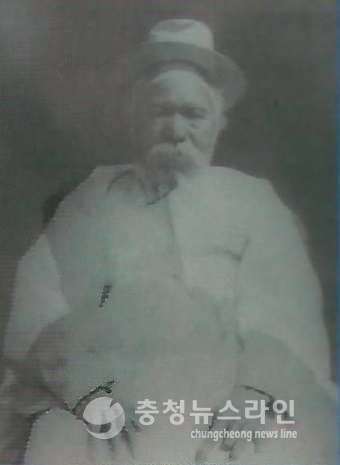
“상여도 상여지만 그 뒤를 따르던 많은 만장의 모습이 뚜렷하게 기억납니다.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였어도 그런 광경을 보고 ‘우리 할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구나!’하는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”
몇 번이고 손가락을 잘라 혈서를 쓸 만큼 일본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대상이었지만 김상정 선생은 대청마루에서 잠이 든 손녀가 감기에 걸릴까 아픈 허리를 무릅쓰고 방에다 옮겨 재우는 자상한 할아버지였다고 한다.(김상정 선생은 일제의 고문으로 장애를 입었다.)
아이들의 훈장선생님으로 마을주민들의 정신적 지주로, 맡은 역할의 무게 때문에 자신에게는 한없이 엄격했지만 집 주변에 많은 유실수를 심어 항상 이웃과 나누는 정이 넘치는 인물이었다.
이렇듯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할아버지였던 까닭에 김 씨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다.
아버지를 비롯한 후손들이 할아버지의 업적을 알리는 일에는 열심이었던 반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생가를 관리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것이 두고두고 아쉬운 것이다.
자신 또한 수십 년 동안 마음만 가지고 있었지 실천을 못한 것에 대해 너무나 죄송스러울 뿐이다.

“1954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잠시 동안은 마을분이 세를 들어와 살았는데 그분도 돌아가시고 난 뒤로는 빈집인 상태로 있었으니 수십 년이 훌쩍 지났죠. 지금은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허물어 졌으니 면목이 없네요”
사람의 손길과는 담을 쌓은 것 같은 생가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수년전부터 김 씨가 짬짬이 시간을 내 돌봐 왔다. 봄부터 여름까지 일일이 손으로 풀을 메고, 주변을 정리한다고는 했지만 모든 걸 혼자 하다 보니 별다른 태가 안 났을 뿐이다.
현재 김상정 선생의 생가는 기이한 모양을 하고 있다. 건물은 폐가 수준인데 지붕은 새것이다.
3년 전 서까래와 대들보가 무너질 것을 염려한 김 씨가 비라도 피해보자는 심정으로 지붕을 보수한 것이다.
급한 불은 껐지만 김 씨의 마음은 편치 않다.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생 동안 또다시 일을 벌일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.

그래도 김 씨의 발걸음은 할아버지의 숨결이 남아 있는 생가로 향한다. 조그마한 집 한 채지만 치열하게 조국을 사랑했던 한 독립운동가의 흔적임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때까지 곁을 지킬 생각이다.
“생가 복원이니 공원조성이니 하는 거창한 것은 바라지도 않아요. 평생을 소박하게 살았던 할아버지께서도 원하지 않을 거 같고요. 다만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,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보수라도 조금씩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저도 미력이나마 힘닿는 데까지 노력해볼 심산입니다”
기회가 되면 독립기념관에 기증한 것 이외의 유품을 정리해 생가에 전시해 보고 싶다는 김부용 씨..
70을 넘긴 손녀가 진정 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할아버지의 흔적을 남기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든다.

▲ 김상정 선생이 혈서를 쓸 때 사용했던 칼

